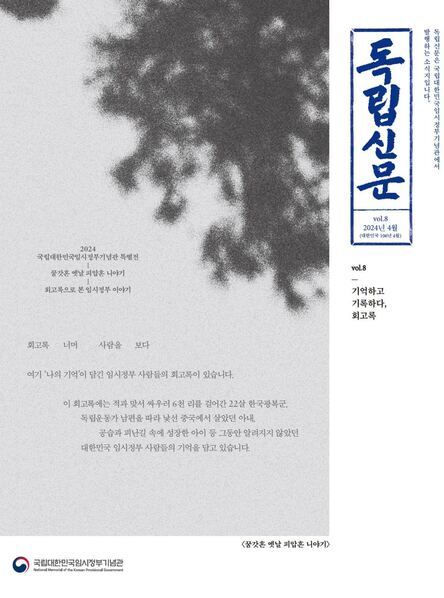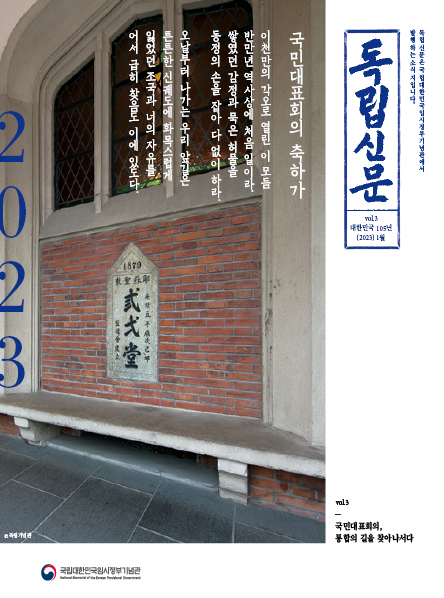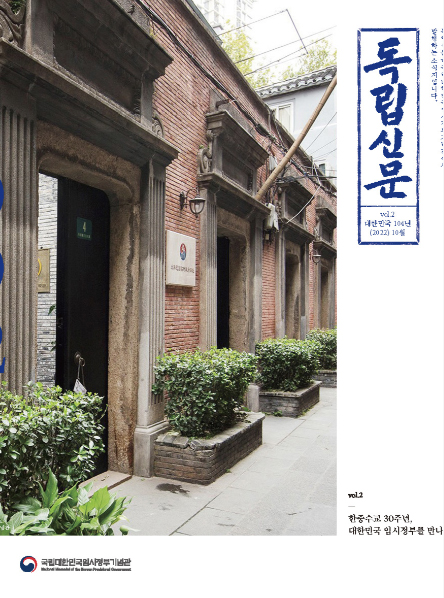특집
하와이, 돌아올 수 없던
사람들의 흔적
─ 글·사진. 김동우(『뭉우리돌을 찾아서』 작가)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 한 증기선이 서서히 항구를 밀어낸다. 이내 눈배웅을 거두고 돌아서 등을 져야 했던 순간, 잠시의 이별이라 옹송그려 본들 삭풍은 담묵색 바다를 더욱 야단스럽게 할 뿐이었다. 1903년 1월 13일 포와布哇, 서쪽에서 온 이들을 맞은 건 생경한 새소리와 흐드러진 꽃들이었다. 섬은 곧 무망한 전옥이 돼버린다. 혼곤함에 눈을 감아보지만, 노란 어둠 속에 밟히는건 체념과 상념 뿐. 세민굴 같은 숙소에서 선잠에 든다. 쪽빛 바다 짙은 담묵색으로 변할 때쯤, 연완한 달뜬 얼굴 아렴풋하다. 격조한 고향은 무심한 것인가, 몽매한 것인가, 머나먼, 다시갈 수 없던, 그들의 편도片道.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았다. 그 역사를 좇아 매일 같이 하와이에 남겨진 한인 묘지를 찾아다닌 적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지워지고 있는 얼굴을 수 없이 마주했다. 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 있던,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정확히 120년 전, 제물포에서 하와이로 간 사람들, 그들은 모두 왔으나, 가지 못한 운명이었다. 다행히 그 역사는 기억되고 있다. 불행히 그들의 얼굴은 잊혀졌다. 여기 이들의 상狀이 있다. 하와이 디아스포라 120주년, 이 사진들이 기억과 기억을 잇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역사는 기록할 때 역사가 될 수 있다.
©김동우
©김동우
©김동우
©김동우
©김동우
고향은 열병 같은 거
화톳불처럼 열이 오르고 오한이 드는
끙끙거려 본들 쉬 도망갈 수 없는
아득하기만 한 기억 저편의 그림자가
환영이 돼 돌아온다
머리끝까지 이불을 올려
어둠에 든다
태곳적 엄마 품이 그랬던가
꿈속을 달려 달큼한 꽃향기 진동하는 동산에 올라
그대 손을 잡고 내달린다
멀리 처마 밑
고드름 익어가는 소리 귓가를 울린다
마치 그 소리 있던 것 마냥
꼬드득 꼬드득
고향은 열병 같은 거, 고향은 낫지 않는 거
©김동우
©김동우